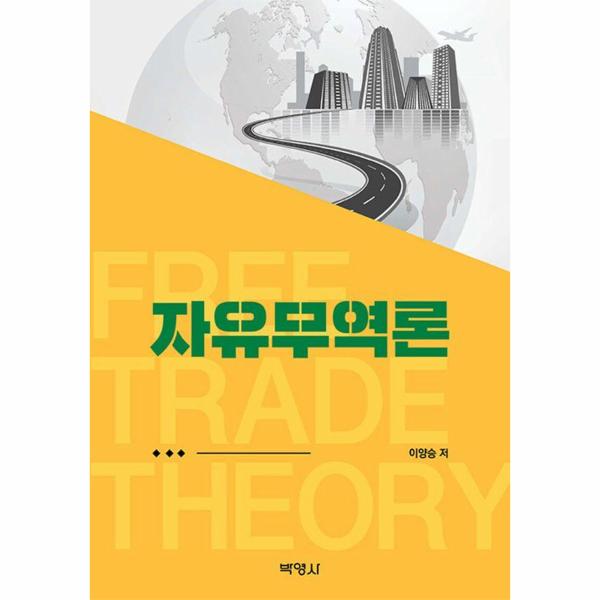이 책의 제목은 <자유무역론>이다. ‘국제무역론’ 책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굳이 책 제목을 <자유무역론>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 ‘무역’은 대부분 국가 간에 일어난다. 그렇기에 굳이 ‘국제’라는 말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핵심은 ‘자유주의’냐 ‘보호주의’냐이다. 자국 시장 내에도 ‘규제’가 있듯 국제 시장에선 ‘규제’가 있다. 무역장벽을 통한 보호조치다. 2025년 2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바야흐로 보호주의 시대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국제무역 조류에도 사이클링이 있다. 일정한 주기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오간다. 그에 따라 국가들 간에 ‘상호작용(interaction’이 발생한다.
엉뚱한 질문을 던져 보자. 인류는 동물과 뭐가 다를까? 학자들은 대개 동물과 달리 인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한다. 전공에 따라 그 ‘뭔가’가 달라질 뿐이다. 그 답에 학자의 정체감이 숨어있다. 경제학자 시각에서는 ‘뭐’가 다를까? 동물과 달리 인류는 ‘교환’을 할 수 있다. 생각해 보라. 인류는 자신이 쓰고 남는 것 또는 잉여분을 버리지 않고 ‘시장’에서 다른 것과 바꾼다. 즉, ‘교환’을 한다. ‘교환’이 있기에 인류는 더 많은 걸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자유는 ‘교환’을 쉽게 하고, 규제는 ‘교환’을 더디게 한다. 중상주의 시대에 부(wealth는 금은의 양을 본 아담 스미스가 부의 개념을 재정립한 결과, 부는 ‘소비가능성’이라 파악될 수 있다. 이 책은 ‘무역을 왜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한다. 싱겁지만 그 답은 ‘뭔가를 얻기 때문에 무역을 한다’는 것이다. ‘뭔가 얻는 것’은 바로 ‘무역이득’이다. 그 ‘무역이득’의 실체를 놓고 학자들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리카르도와 헥셔-올린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무역이론은 그 무역이득이 ‘소비가능성’ 확대라고 본다. 즉, 각 나라별로 ‘생산가능성’이 주어졌을 때 ‘비교우위’에 입각,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각 나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