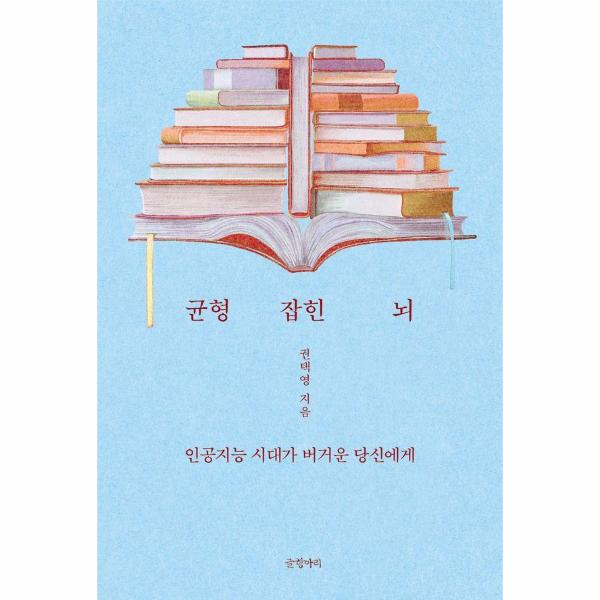프로이트부터 라캉, 캔델과 다마지오까지
소포클레스부터 헨리 제임스, 주요섭과 윤동주까지
정신분석학, 뇌과학, 문학이 합쳐진 신개념 마음 지침서
『생각의 속임수』로 기억을, 『감정 연구』로 감정을 다룬 저자가 『균형 잡힌 뇌』로 3부작을 완결지었다. 저자 권택영은 영문학에서 출발해 정신분석학, 뇌과학까지 뻗어가며 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자다. 특히 미국에서 출간한 Psychology in the Fiction of Henry James: Memory, Emotions, and Empathy는 제임스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뇌과학과 융합한 저서로, 학문의 경계에 갇히지 않는 저자의 자유롭고도 창의적인 사유를 잘 보여준다. 이번에 선보이는 『균형 잡힌 뇌』는 3부작의 대단원으로서 공감을 다루고 있다.
‘공감’이라는 말 자체는 흔히 쓰인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단순히 남과 생각을 같이한다는 의미에서의 ‘동감’이 아니다. 그렇다고 남과 감정을 일치시키는 ‘감정 전염’만도 아니다. 진정한 공감이란 그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남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그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와 충분히 가까워져 정서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과 너무 가까워져 그에게 집착해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 그와 유리되어서도 안 된다.
이렇듯 까다로운 일을 제대로 수행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뇌과학은 한결같이 그 답을 ‘인문학’으로 내놓고 있다. 사실 뇌과학은 늘 인문학과 융합해서 발전해왔다. 시냅스 연결 등 인지적인 발달뿐 아니라 공감 능력 등 정서적인 발달까지도 인문학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빙하의 수면 아래를 발견한 이래로 우리는 의식만을 가지고 우리를 정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뇌과학과 인문학 사이, 동감과 감정 전염 사이의 기묘한 연결 고리를 살펴볼 차례다. 30여 년간 일궈온 저자의 사유를 들여다보자.
공감을 못 하는 뇌와 남에게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