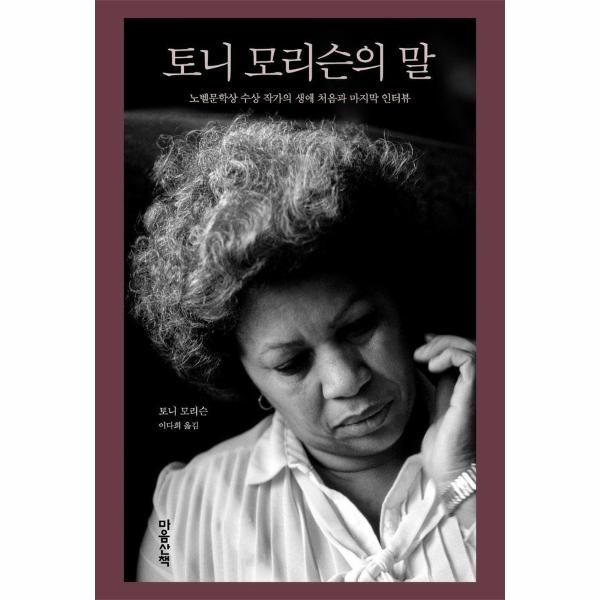역사의 페이지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삶을 돌려주는 글쓰기
푸른 눈동자를 갖고 싶어 하는 흑인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가장 푸른 눈』, 자신의 아이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걸 보느니 차라리 직접 죽이기로 마음먹은 탈주 노예 여성의 이야기 『빌러비드』 등, 토니 모리슨의 소설은 어디에도 뚜렷이 기록되지 않은 존재를 찾아내 이야기의 중심에 놓는다.
노예제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이 첨예하던 19세기에도 미국 소설에서 흑인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모리슨의 말처럼, 당시 흑인의 존재는 “모든 음침한 상징” 속에, “유령의 출몰”에, “무질서, 붕괴, 성적 일탈”에 그림자처럼 드리울 뿐이었다. 토니 모리슨은 “차마 못 할 말”로 취급되던 존재들에게 피와 살, 감정과 맥락, 이름을 되돌려준다.
‘주피터’나 ‘매리’가 방으로 들어왔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깜둥이’, ‘노예’, ‘흑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제나 수식어가 필요했던 것이죠. 수식어는 지울 수 있습니다. 윌라 캐더가 ‘사피라와 낸시’라고 했다면 전혀 다른 책이 됩니다. 전략도, 권력 구도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캐더는 ‘사피라와 노예 소녀’라고 했습니다. 제목에서 소녀는 이름이 없습니다.
_74쪽
모리슨은 흑인 운동 내에서 생겨난 뒤틀린 경향에도 기민하게 반응했다. 흑인을 무조건 영웅적이거나 아름답게 그리려는 풍조에 저항했고, “양자택일의 각본”을 따르지 않았다. 토니 모리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진영에 자리를 잡고 상대편을 비판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방식으로 흑인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었다.
이 시절은 백인들은 꺼지라는 식의 책이 속속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백인 꺼져’ 운동은 여러 공격적인 주제를 아우르고 있었는데 하나는 ‘흑인은 아름답다’였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건 또 뭐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나? 내가 아름답다고?’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잠깐만 있어봐. 나의 아름다운 흑인 여왕님이 어쩌고 하기 전에 현실이 과연 어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