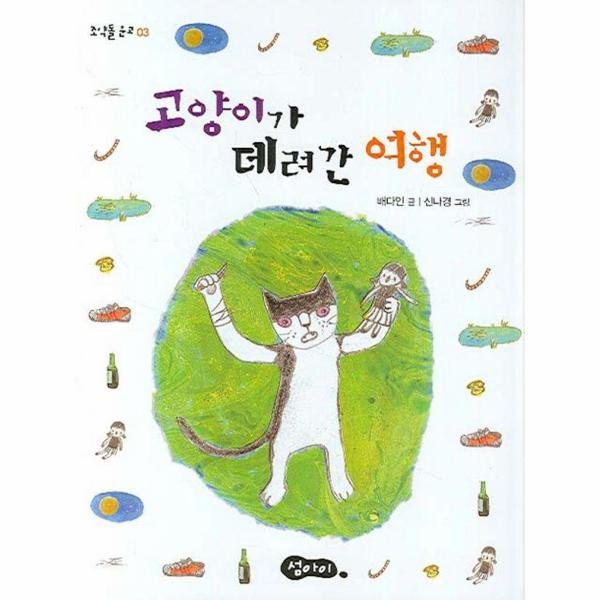이 작품은 빛나와 고양이의 관계 맺기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바라며, 따스한 마음이 모든 이에게 통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어려움에서도 굴하지 않고 모든 일을 헤쳐 나가기를 바라며, 항상 그 주위에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에게 부모의 죽음은 자신이 기대고 있던 모든 것, 혹은 자신 그 자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실이다. 전무(全無는 전부(全部의 가장 가까운 형제요, 친구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었을 때야말로 모든 것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시간이다. 주변에서 편하게 애정으로 자연스레 권하는 한마디 말의 힘이다. 그저 ‘하찮은’ 고양이 한 마리가 마련한 ‘작은 계기’ 같은 것이다.
배다인 작가는 말하고 있다. “새로운 만남을 위해 마음을 열어 두었나요? 어! 마음을 나눌 상대를 벌써 발견했다고요? 그럼 이제 살며시 말을 걸어보면 되겠군요. 마음속에 자리했던 각기 다른 딱딱한 응어리들이 말끔히 사라질 거예요. 식물이면 어떻고 동물이면 어때요. 망설이지 마세요. …… 우리 주변에 따뜻한 온기가 점점 넓게 퍼지겠군요.”
빛나가 고양이를 따라가 만나고 온 죽은 부모님의 실체,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말하는 고양이의 실체, 못 믿겠다고요? 그렇다면 그대는 벌써 따뜻한 온기를 잃은 사람이겠군요.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이 한결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삶의 이편과 저편의 관계가 그렇게 딱딱한 언어와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혀 있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풍요로운 삶이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동물들, 식물들이면 어때요.의 귀한 생명작용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속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는 꼭 ‘행복한 미소를 띤 채’ 죽은 고양이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깨달음, 그것까지는 무리일까?
줄거리
빛나는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엄마의 동생, 외삼촌댁에서 지내고 있다. 외삼촌과 외숙모 사이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해 냉전을 벌이던 두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