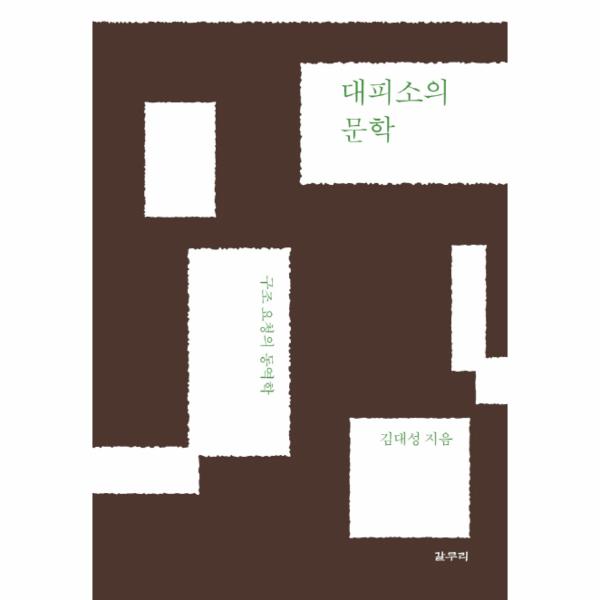머리말 7
들어가는 글 : 도움을 구하는 이가 먼저 돕는다 15
1부 대피소의 건축술 : 구조 요청의 동역학
바스러져 가는 이야기를 듣는 것, 구조 요청에 응답하는 것 28
익사하는 세계, 구조하는 소설 46
불구의 마디, 텅 빈 장소의 문학 64
아무도 아닌 단 한 사람 73
거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83
‘두 번’의 이야기 : 발포하는 국가, 장전하는 시민 92
“괴물이 나타났다, 인간이 변해라!” 106
2부 대피소 너머 : 추방과 생존
한국문학의 ‘주니어 시스템’을 넘어 113
‘쪽글’의 생태학 : 비평가의 시민권 126
생존의 비용, 글쓰기의 비용 : 우리 시대의 ‘작가’에 관하여 148
잡다한 우애의 생태학 169
아직 소화되지 않은 피사체를 향해 쏘아라 : 1인칭 Shot, 리얼리티 쇼와 전장의 스펙터클 177
박카스와 핫식스 197
3부 대피소의 별자리 : 이 모든 곳의 곳간
세상의 모든 곳간(들 206
Hello stranger? Hello stranger! : 새로운 우정의 물결, 코뮌을 향한 열정 233
이야기한다는 것,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른다는 것 250
고장 난 기계 261
텃밭과 마당 270
모두가 마음을 놓고 빛/빚을 내던 곳에서 : <생각다방 산책극장>을 기리며 278
발견하고 나누고 기록하는 실험의 순간들 : 생활예술모임 <곳간>을 경유하여 284
2가 아닌 3으로 292
곳간의 사전, 대피소의 사전 301
‘을’들의 잠재성 : <데모:북> 1회를 열며 310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우리들의 존재 : <데모:북> 2회를 열며 315
나가는 글 ― 대피소 : 떠나온 이들의 주소지 327
김대성의 구원의 문(門학에 부쳐 _ 한받(자립음악가 332
수록글 출처 335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
‘생명’이 있어야 할 자리를 ‘생존’이 대체했다. 『대피소의 문학』은 존재의 고유한 삶이 아닌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재난의 일상화라는 상황 인식 속에서 출발한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지만 누구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무력감 속에서 읽고 쓰는 문법도 파괴되어 간다. 이제 문학은 현실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구해내는 것을 통해 재발명되어야 한다. 『대피소의 문학』은 제도화된 문학장만이 아니라 참사의 현장에서, 가만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운 생활의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길어올려지고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곳곳의 현장에서 사력을 다해 지켜내고 있는 사람의 말, 그 목소리에 잠재되어 있는 힘이야말로 새로운 문학의 역능이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발현되는 문학과 구조 요청에 응답하는 목소리들
『대피소의 문학』은 참사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구조 요청’이 가까스로 지켜지고 있는 희망의 목소리임을 문학 내외부 텍스트를 넘나들며 발굴해내고 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현실과의 낙차라는 심연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기왕의 문학과 달리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수많은 기록과 구조 요청에 응답하는 목소리에서 누군가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문학적인 것’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발명해낸다.
현장에서 발현되는 문학은 작가라는 개별적인 정체성이 아닌 집단적인 기록 노동의 모습으로, 마치 여럿의 목소리가 합창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울려 퍼지며 진동한다. 이 책의 1부가 즉각적인 응답을 위해 쓰이는 ‘순간 문학’인 르포적인 글쓰기를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르포적인 글쓰기는 장르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문학장 내부에서도 진동하고 있다. 용산참사 이후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김애란뿐만 아니라 윤이형, 김이설, 이주란, 조해진 등의 소설에서도 참사 이후 기왕의 문학적 질서로는 말할 수 없는 영역을 개척해나가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대피소의 문학』은 재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