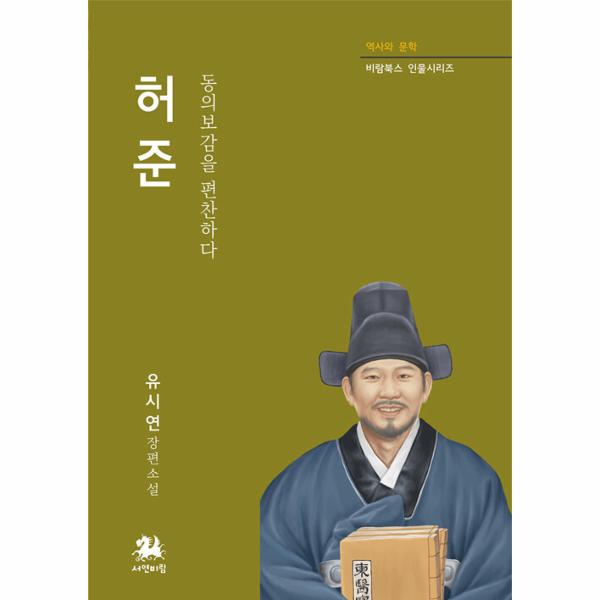책 속에서
초여름의 숲이 우거지며 날이 더웠다. 그날 이후 허준은 숙정의 모습을 떠올렸으나 김시흡은 먼 길을 떠나고 홀로 동분서주하며 큰집과 작은 집을 오고 갔다. 가끔 김시흡의 심부름으로 절에 다녀오곤 했다. 잘 말린 약재나 쌀을 말 잔등에 싣고 절에 다녀왔다. 때때로 숯을 망태기에 담아 갖다줄 때도 있었다. 여름이 깊어 갈 무렵이었다. 바위 계곡을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가 시원했다.
“숙정 아기씨는 왔다 갔나요?”
“으흠, 인제 보니 도련님 흑심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발목이 삔 건 다 나았는지요.”
“대감이 침술 하나는 끝내줍디다. 다음날 멀쩡히 걸어서 산문을 내려갔습니다.”
“다행입니다. 삼촌이 그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겠어요.”
“도련님, 외가는 대대로 약재로 유명한 집인디 많이 배워두십시오. 혹시 압니까. 약재로 조선을 들었다 놨다 할지.”
“그깟 약재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글공부를 해야…….”
허준은 여기까지 말하다가 그만 말문이 턱 막혔다. 자신은 글공부를 해도 아무 쓸모가 없는 신분임을 자각했기 때문이었다. 상좌승은 아마도 집안 내력을 알지도 모를 일이었다.
“무슨 한숨이 그리도 깊어집니까.”
“막막해서 그럽니다.”
“좋은 집안 내력을 배워서 써먹으십시오. 도련님 외가는 대대로 한방 약재와 치료술로 유명했습니다.”
“그걸 어찌 압니까.”
“주지 스님께 들었습니다.”
허준은 어머니나 삼촌에게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 그냥 집안에 약재가 많고 일반 백성집 보다 그 방면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는구나 싶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사실 지난번 숙정에게 침을 놓는 김시흡을 보고 의외라서 놀라기는 했다. 비로소 허준은 어린 시절 배앓이를 하거나 머리가 아플 때 어머니가 무슨 풀인가를 끓여서 먹이던 걸 기억 해냈다. 어머니가 배를 쓰다듬어주면 금세 나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외가에서 보낸 지 해가 바뀌었는데 허준은 본가로 떠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 김시흡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