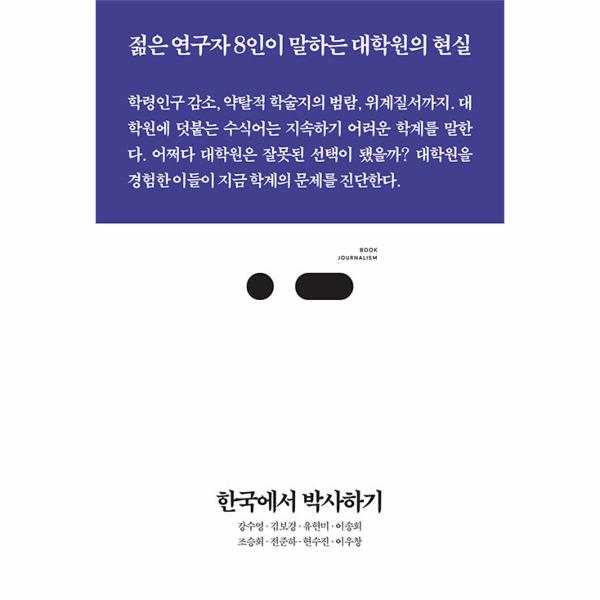프롤로그 ; 왜 대학원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 대화한 이들
1 _ 내가 경험한 대학원
문제를 직면하다
대학원의 위계적 문화
대학원의 교수 의존성과 대학원생의 인권
목소리 내기
2 _ 떠나고 싶은 대학원, 남고 싶은 대학원
‘대학원생 밈’ 너머의 대학원생
왜 대학원을 피하는가
남고 싶은 대학원 만들기
3 _ 한국는 어쩌다 문송한 나라가 되었나
지금, 여기의 인문·사회학계
인문사회과학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인문사회과학은 언제 필요해지나
4 _ 대학원의 미래, 미래의 대학원
무거운 꼬리표, 융복합
세대교체를 앞둔 학계
나의 미래, 연구자의 미래
에필로그 ;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의 추천사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암울 속에서 희망을 말하기
대학원을 꿈꿨던 때가 있었다. 대학원 바깥에서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이 상상되지 않았고,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원이 가장 좋은 공간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럼에도 대학원을 택하지 않았다. 이유는 다양했다. 생계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나를 덮쳤다. 인문학 공부는 ‘재미있는’ 일이었지만 ‘좋은’ 선택지는 아니었다. 재미있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던 나에게 대학원 진학을 포기했던 시기는 하나의 변곡점으로 남았다.
미국의 유명 구직 앱 ‘집리쿠르터ZipRecruiter’가 1500명 이상의 대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졸 구직자 44퍼센트가 저널리즘, 사회학, 교육학, 자율전공 등의 전공 선택을 후회했다. 이들은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컴퓨터 공학과 경영학을 선택할 것이라 답했다. 요컨대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학계와 직장,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이 됐다.
이 인식의 핵에는 인문과 사회과학에 대한 합의가 요원해진 시대가 위치한다. 지식인이자 인텔리로서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물음을 던지던 학생 운동 시기 인문학의 무게감은 이제 없다. 공적인 논의와 새로운 질문을 자신의 책무처럼 느끼고 대중과 만나던 공공 지식인도 어딘가로 숨은 것처럼 보인다. 덩치 큰 유령처럼 ‘인문학의 위기’는 매번 불려 나왔지만 그 빈번함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지난한 증거로만 남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노릇이다. 학계의 위기는 순식간의 산업의 위기가 되고, 얽히고설킨 위기는 미래를 위협한다. 우리는 스러지려는 미래를 구하기 위해 지금 여기의 학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한 학계의 모습에는 어딘가 기시감이 들었다. 여성 연구자의 불가피한 커리어 중단, 수직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대물림되는 답 없음의 감각, 설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율성을 위시한 비효율까지. 모든 대학원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닮아있었다. 오히려 사회 전체의 문제가 학계라는 좁은 공간에 응축된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