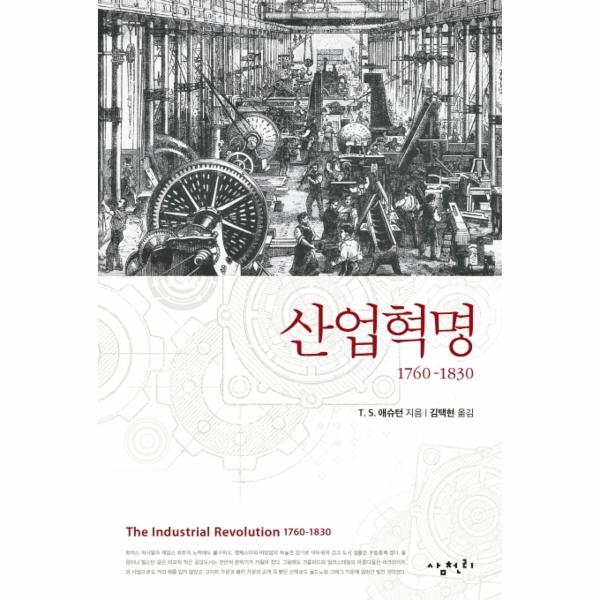200년 전의 산업혁명, 현대사회의 기틀이 마련되다
예나 지금이나 전환기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바라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일은 당대의 권위 있는 학자와 지식인에게 숙제와도 같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스마트 공장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싸고 유행처럼 번지는 담론은 글로벌 기업가와 학자, 국제기구, 언론, 정부까지 나서서 과감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 반대편에, ‘혁명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가 불러올 일자리 감소와 부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굳건하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경제적인 삶, 나아가 사회적 관계와 정치문화까지 어떻게 변화시킬까?
정확히 200여 년 전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제임스 와트, 조지 스티븐슨, 리처드 아크라이트, 에이브러햄 다비 같은 혁신가들의 노력으로 온갖 아이디어와 기계장치가 영국인의 일상생활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었다. 금융과 공장, 철도와 운하, 일터와 의식주, 시간관념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웬만한 현대사회의 원형이 이때 기틀을 마련했다.
산업혁명의 격변기를 산 당대의 석학 토머스 맬서스(1766~1834는 생계 수단에 대한 ‘인구 압력’이라는 유령에 억눌린 채 《인구론》을 펴냈다. 그 뒤 아널드 토인비는 ‘1차 산업혁명’에 관한 본격적인 학술서 《잉글랜드 산업혁명 강의》(1884에서 산업혁명이 생산력과 부(富를 증대시켰을지는 몰라도 일반 대중의 삶을 개선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비관론’의 흐름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폴 망투, 비어트리스 웹 부부, 헤먼드 부부 같은 학자들로 이어졌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모리스 돕은 산업혁명을 근대 자본주의 역사 발전의 한 국면으로 보았지만 노동계급의 혹독한 사회경제적 상태에 주목함으로써 ‘비관론’의 대열에 섰다.
이 책의 저자 T. S. 애슈턴은, “산업혁명은 비관론자들의 주장처럼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영국 사회와 영국인을 기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