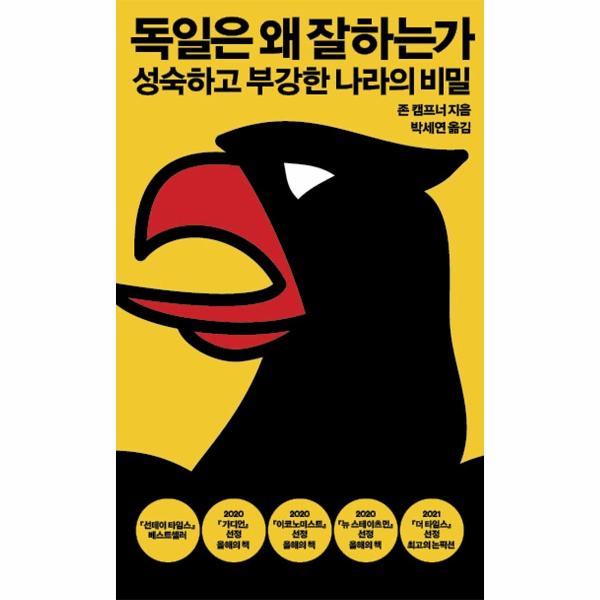규칙에 대한 강박
독일인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유독 강조되는 것이 <규칙에 대한 강박>이다. 이 책은 몇 가지로 흥미로운 일화를 들려준다. 한번은 저자가 새벽 4시에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관에게 딱지를 떼인 일이 있었다. 그는 <이 한적한 차로 에 앞으로 몇 시간은 차가 지나다닐 것 같지 않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차가 다니든 안 다니든 <규칙은 규칙이다.> 또 다른 일화. 어느 화창한 일요일 점심시간, 저자는 아파트 발코니로 나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록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때 뉴스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자 독일인 여자 친구가 라디오를 꺼버렸다. 그 시간이 루헤차이트(독일에서 의무적으로 조용히 해야 하는 시간이고, 이웃집 노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
저자는 독일인의 <규칙에 대한 강박>을 패전 후 잿더미(물질적·정신적으로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서 찾는다. 승전국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등이 <어제의 영광>을 바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면, 패전국 독일은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준거점이 거의 없었다.> 대신 그들은<절차에 대해, 즉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것에 대해 열정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상징적인 작업이 1949년 임시 헌법(향후 통일 전까지으로 만들어진, <세계적으로 위대한 헌법적 성취 중 하나>로 평가받는 <기본법>이다.
독일은 <전후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 정체성과 안정, 자기 가치를 전적으로 법의 지배에 의존하고 있다>. 저자의 눈에 독일인의 애국심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기보다 <헌법에 대한 애국심>에 가깝다. 라이프치히에서 만났던 펑크족 뮤지션도 비슷한 얘기를 들려준다. 그는 독일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말한다. 그 영역에서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 <국가의 역할은 약자가 강자에 맞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