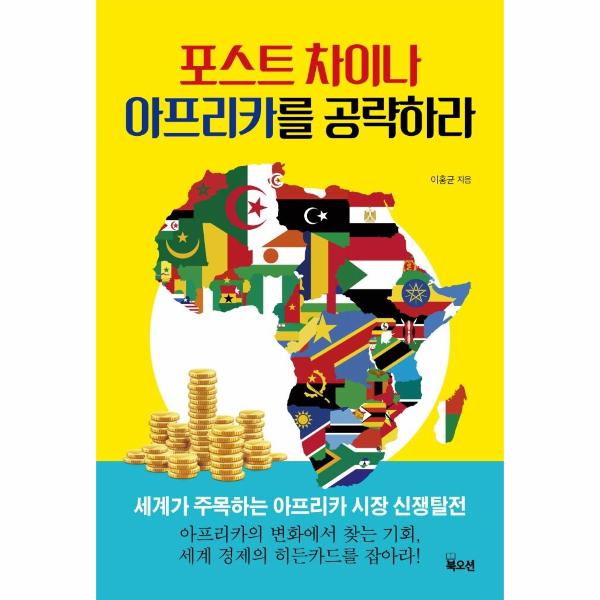<책 속으로 >
한 시인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는 생기는 것도 없이 죽어라고 시인을 찾아갔더랬다. 한약을 달이고 ‘기적의 생명비누’라고, 정말이지 전략적이지 못하게 사이비 냄새나는 이름을 붙인 네모난 약을 만들어 수시로 긁어 먹으라고 권했다. 그는 산에 토굴을 파고 그 속에 기운 없는 시인을 밀어 넣었다. 흙 기운이 죽을 사람도 살려내길 바랐다. 어느 이른 아침 그가 어슴푸레한 거실에 앉아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에 대한 나의 신뢰는 그때부터였다. 실은 그가 터무니없이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며 죽음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환자에게는 살 수 있다고 의사답지 않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서부터였다. 한의사라는 사람이 병든 사람들 뒤에서 몰래 울기나 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혹이 아니라고 우겨대기는.(「혹」 중에서
씨앗을 받는 마음은 늘 황홀했다. 손톱만 한 호박씨, 수세미씨, 솔솔 뿌려지는 파씨, 상추씨 같은 채소 씨앗에서부터 까맣고 단단한 분꽃씨, 동글납작한 접시꽃씨, 씨방을 탁 터뜨리며 튀어나오는 봉숭아꽃씨, 뾰족뾰족한 코스모스씨, 그런 꽃씨들에 이르기까지 내년을 기약하며 씨앗을 받고 있으면 새봄의 흙냄새가 코끝에 기억나면서 마음이 설다. 그런데 씨앗은 채소와 곡물과 꽃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마다 그가 걸어간 발걸음에도 씨앗이 있다는 것, 평생을 궁구한 생각과 빛나는 정신의 씨앗이 있다는 것, 정말 하고픈 그 이야기 앞에 앉아 있는 이 아이들은 공책 한 권과 볼펜 한 자루에 눈을 빛내는 중학생이다.(「씨앗을 뿌리는 사람」 중
선생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중학교 어린 학생들에게 이야기해도 좋은 것인가? 그러나 나를 꽁꽁 숨기고서는 몸의 병이 마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어려웠다. 병이 나자 시계의 초침이 조용해졌다. 몸이 아프니 마치 안개가 걷힌 듯, 그 복잡하고 괴로웠던 일들이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병을 치료하는 것 이외에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없었다. 먼 곳을 향해 늘 목마르던 시선을 거두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