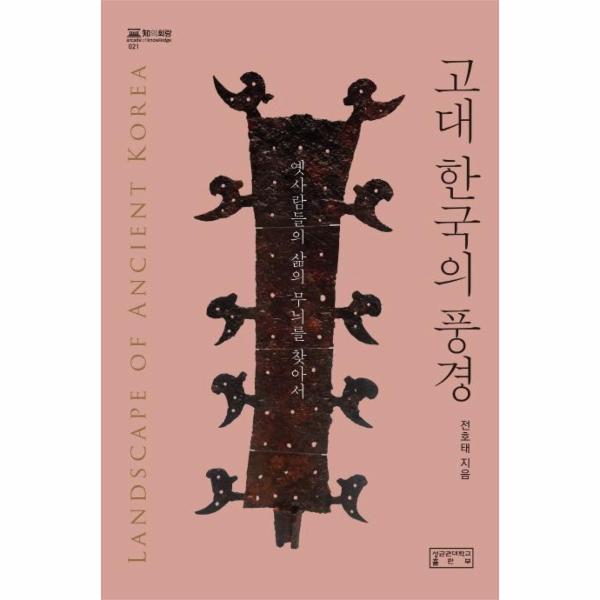책을 열며
제1장 그가 목 놓아 부르던 고래, 손짓하여 오라고 하던 사슴
― 암각화와 주술
제2장 신의 기운이 서린 뿔
― 청동기의 장식무늬
제3장 신명을 몸에 두르고
― 유목예술
제4장 둥글고 네모지고 깊고 넓게 펼쳐진 새로운 공간
― 집과 무덤이 보여주는 건축가의 우주
제5장 삶의 풍요를 꿈꾸며 빚은 유려한 선
― 사발, 접시, 온갖 그릇과 밥
제6장 색을 입히고, 무늬를 넣어
― 옷과 장신구
제7장 즐겁게, 튼튼하게
― 놀이와 운동
제8장 생생한 숨소리와 땀방울로 되살아나는 하루
― 벽화 속의 일상
제9장 정토
― 벽화 속의 낙원
제10장 해, 달, 별들 사이에 숨은 내 안식처
― 벽화 속의 수호신, 사신四神
제11장 신선이 아니면 서수라도
― 마침표 없는 삶을 꿈꾸며
제12장 소박하고 부드럽게, 우아하고 신명나게
― 고대 한국의 풍경
주ㆍ도판목록ㆍ참고문헌ㆍ찾아보기
총서 ‘知의회랑’을 기획하며
저 바위에 새겨진
교감의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문화유산이란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을 무엇에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남겨진 기억’이다. 저자는 암각화에서부터 고분벽화까지, 청동검에서부터 금제 왕관과 목걸이까지 그리고 빗살무늬토기에서부터 정겨운 모습의 진묘수(鎭墓獸, 무덤을 지키는 동물 석상까지, 지금껏 우리에게 전해오는 다채로운 문화유산들을 가지런하게 재정리해놓으면서 그곳에 새겨진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을 차근차근 소환해나간다.
냇물 건너 편평한 바위에 깨알 같이 새겨진 암각화 앞에선 고래사냥을 둘러싸고 펼쳐졌을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생존의 방식을 떠올려보고, 다리도 짧고 뭉툭하며 몸은 통통해 마치 귀여운 곰 인형 같은 백제 무령왕릉의 진묘수 앞에선 무덤 안으로 들어와 해코지하려던 사귀(邪鬼의 마음조차 녹여버릴 그 짐승만의 미소를 색다르게 풀어낸다. 자연과, 또 어쩌면 현대인들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영혼과 교감하는 고대인들의 방식을 저자는 그렇게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주제들을 이어 붙이면
고대사회는 입체적으로 조감이 되고
저자는 말한다. “타임머신을 타듯 의식상으로나마 옛 시대로 돌아가 눈에 드는 몇 가지라도 기억에 담아 돌아오기를 소망했다. 벽화, 유물, 여러 유적의 형태로 남은 옛 모습에서 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입체적으로 다시 그려보려 했다.”
그리하여 고대인들이 살거나 잠든 집터와 무덤에서, 먹거리를 담아두던 온갖 그릇에서, 또 색을 입히고 무늬를 넣어둔 옷과 장신구에서 그들의 일상은 퍼즐처럼 재조합된다. 마치 건축가를 닮은 공간 인식으로부터 그들이 삶과 죽음을 대하는 인식의 퍼즐이 맞춰지고, 그릇의 유려한 선형과 고분벽화들마다 빛을 발하는 여인의 옷맵시로부터 그들의 풍요한 생의 욕구와 감각적인 미감의 퍼즐도 맞춰진다. 여기에 ‘저세상도 이 세상처럼 우아하게!’를 되뇌던 귀족의 여유로운 일상은 생생한 숨소리와 땀방울이 가득하던 시종과 평민의 일상과 극단적인 콘트라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