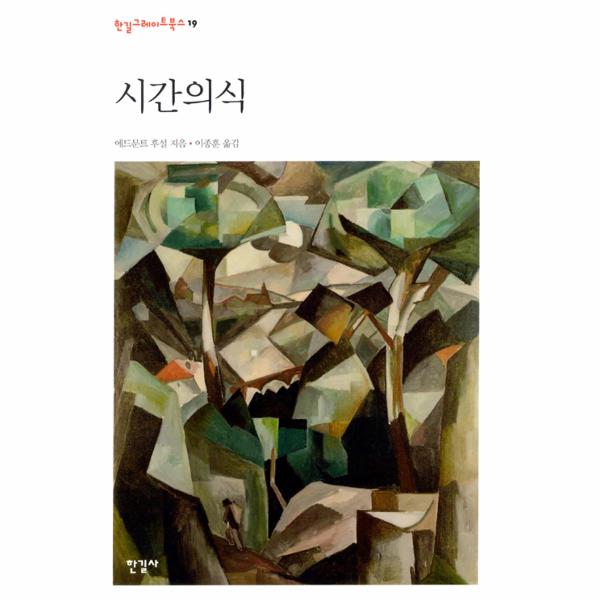후설이 평생 걸어간
선험적 현상학에 이르는 길
후설과 하이데거. 1921년 사진으로 당시 후설은 휴가 중이었다. 하이데거는 후설의 휴가에 동행해 현상학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이어갔다. ?후설전집? 제10권에 실린 ?시간의식? 역시 하이데거가 최종 편집해 발표한 것으로 그의 ?편집자 서문?이 실려 있다.
후설은 선험적 현상학의 창시자다. 그는 평생을 선험적 현상학을 완성하는 데 바쳤다. 임종을 앞두고서는 병상에 누워 구술로 선험적 현상학에 관한 철학적 담론을 풀어냈다. 그의 조교들이 이를 타이핑하고 정서해 원고로 정리했는데 후설이 죽은 후 정리해보니 유고 4만 5,000여 매, 수고 1만여 매, 장서 2,700여 권에 틈틈이 적어놓은 수많은 각주가 남았다. 이 자료들은 1950년부터 ?후설전집?으로 출간 중인데, 여전히 완간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후설이 평생 매달린 선험적 현상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는 보편적 이성으로 모든 학문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해명해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할 철학으로 선험적 현상학을 꼽았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고 곧이어 나치가 등장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암울한 시기였다. 역설적으로 학계에서는 과학만능주의와 심리학주의가 등장해 모든 것을 계량화·정량화·수치화할 수 있다는 인식과 장밋빛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희망이 팽배했다.
이에 대해 후설은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파시즘적·시대적 강령에 제동을 걸고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따져보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따져보고 비판하는 데서 진정한 인간성을 길어 올릴 수 있다는 게 후설의 생각이었다. 그 방법이자 철학이 바로 선험적 현상학이다.
선험적 현상학은 모든 학문이 타당할 수 있는 조건과 근원으로 되돌아가 물음으로써 궁극적 자기책임에 근거한 이론적 앎과 실천적 삶을 정초하려는 ‘엄밀학 학문’이다. 후설은 이를 ‘제일철학’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