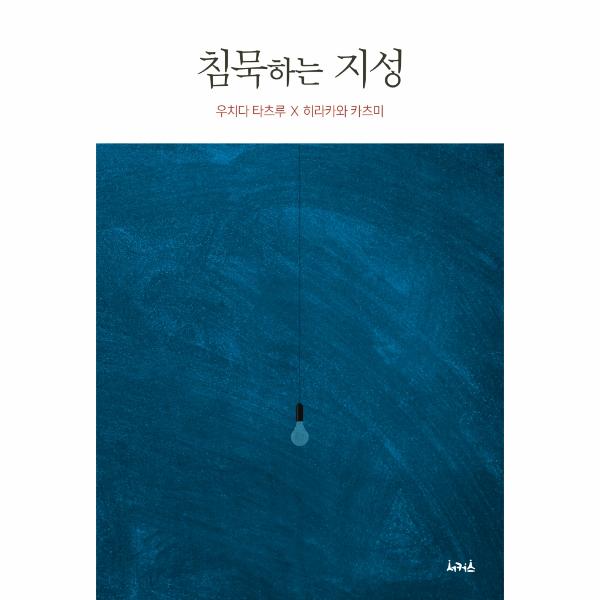책 속에서
여론이 폭주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야. 그럴 때는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만, 수백만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되지. 그런데 자신보다 강한 사람과 무서운 사람이 ‘입 다물어!’라고 일갈하면 전원이 일제히 입을 다물어버려.
여론에는 ‘최후의 한 명으로 남더라도 나는 이 말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개인이 없어. 나는 여론을 그렇게 정의해. 그리고 지금 언론은 ‘여론’을 말하는 장치가 되었다고 생각해.
민주주의 이전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독재자의 시대 혹은 귀족정치의 시대였지. 그 시대로부터 빠져나오는 원동력으로서 데모크라시는 발전해온 거야.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이제는 데모크라시가 ‘무책임의 원흉’이라고 해야 할까, ‘무책임의 체계 그 자체’처럼 되어버렸어. 데모크라시로부터 나오는 말이 여하튼 가벼워지고 만 거지.
우리는 데모크라시 ‘이후의 뭔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런 절호의 시스템은 아직 없을지도 몰라.
근대의 데모크라시라는 것은 ‘그러한 특수한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데모크라시가 적절한 정치 원리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일반 의지를 내면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지. 그 조건이 데모크라시를 작동시키고 유지되게 해. 그런데 이미 이제는 그러한 조건은 성립하지 않잖아.
지금의 민주 국가에서는 국가의 ‘일반 의지’와 ‘국민 한 명 한 명의 특수 의지’가 괴리되어 있어. ‘자신이 자신이기 위해서는 조국이 이러이러한 나라이지 않으면 안 된다. 조국이 이러이러한 나라가 아니면 자신은 자신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파라고 해야 하나 멸종 위기종이라고 해야겠지.
타자에 관해서 말할 때 자신이 서명한다는 것은 자신도 똑같은 장소까지 가서 거기서 어떤 행동을 했을지를 실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러한 태도야말로 ‘비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누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해.
지금 시대의 문제는 ‘비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야. 비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