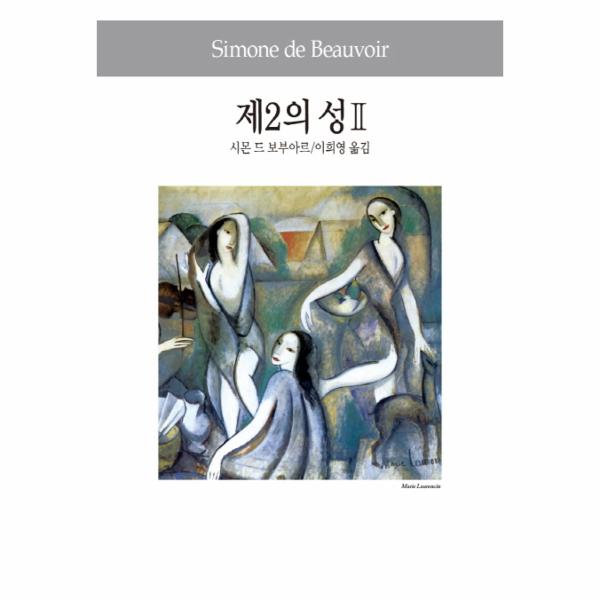여자, 시몬느 드 보부아르
본격적인 여성운동을 촉발시킨 보부아르는 프랑스 파리의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가세가 점차 기울어 갔고 그녀의 아버지는 딸들에게 원망 섞인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로 인해 보부아르는 아버지에 대해 적대시하는 감정을 갖게 된다.
대학교에 진학한 그녀는 지식을 좇게 되었지만 부모님이 지시하는 ‘상류계급 아가씨’로서의 몸가짐도 따르지 않으면 안 됐다. 때문에 낡은 인습과 새 시대 자유로움의 괴리는 고독을 불러 왔다.
사르트르와의 만남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그녀에게 탈출구가 된다. 더욱이 보부아르는 가족들의 비난과 단절에 스스로를 사생아 같다고 여겼으므로 그 만남은 가뭄 속의 단비나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언제나 이곳저곳을 여행 다니며 자유로운 생활을 즐겼다. 그리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서로의 연애와 사상을 격려하거나 조언하며 동반자로 지냈다.
보부아르는 소설가를 지망하고 여러 작품을 발표했지만, 정작 그녀의 지적 사상과 업적이 빛난 것은 철학 분야였다. 아무래도 사르트르 철학의 흔적이 묻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녀는 나름의 체계에 따라 명료하고도 과학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제시한다.
‘초월’하는 인간이 행복하다
보부아르에게 인간의 자유란, 인간이 대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투기하며 현재의 나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활동성을 통해 이룩된다. 정지된 채 투기를 멈춘 인간에게 세상은 그야말로 무의미할 뿐이다. 무의미한 것은 따분함과 불안을 야기한다.
그렇다면 하나의 투기를 완성한 인간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아니다’라고 답한다. 중요한 것은 투기의 완성이 아니라 투기하는 행동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투기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 계속되는 완성 속에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
투기의 목표는 인간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인간에 앞서거나 인간 없이 세계에 존재하는 가치 따위는 없다.
인간성이란 어떤 신성한 것이 아니라 뼈와 살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