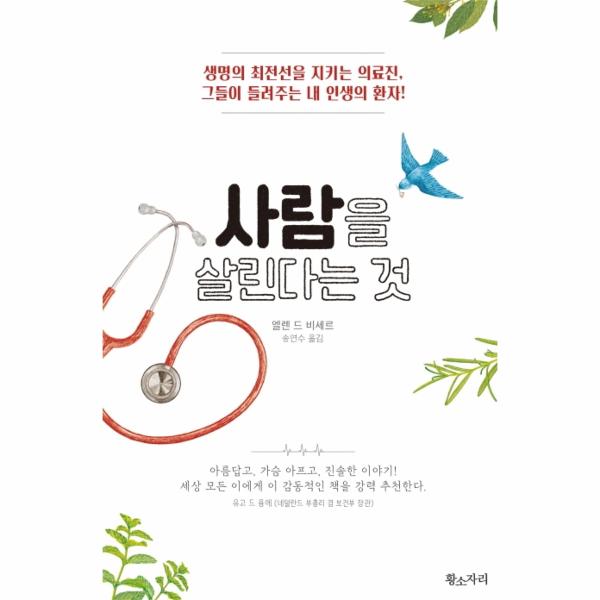추천의 말 _ 5
서문 _ 11
PART 1
성급한 결론, 기막힌 오해 23
병뚜껑들이 사타구니를 갉아대는 느낌 27
한 생명이 가고, 새 생명이 오고 31
“당신 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5
작고 작은 승리의 순간들 39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고 난 후 43
“봤지? 결국엔 내가 이긴다니까.” 47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51
누구에게나 마지막 밤은 온다 55
딸을 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심정 59
두고두고 뼈아픈, 어느 화요일 밤 63
곁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67
비통의 순간에 놓인 사람들에게 71
난민 아이들의 놀라운 회복력 75
차가웠던 나의 심장 79
지하로부터의 수기 83
PART 2
아픈 딸아이의 아버지가 될 때 89
생사를 둘러싼 결정 앞에서 93
출구는 결국 스스로 만들어낸다 97
지나친 호의가 화살이 되어 101
환자가 된 후 비로소 절감하는 것들 105
거울 속 낯선 얼굴과 만난다는 것 109
해일처럼 덮치는 공포의 기억들 113
그날 밤, 그 노부인 117
목소리를 잃은 한 남자에게 일어난 변화 121
사소하지만 명확한 위로 125
내가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까? 129
거짓말처럼 솟구쳐오른 내면의 힘 133
그날 이후, 크리스마스 137
비닐봉지에 유기된 신생아 141
지나간 자리마다 남은 선명한 흔적 145
“펄은 사랑을 먹고 산답니다” 149
유머의 잠재력 153
PART 3
죽음이란 본디 삶 한가운데 있는 것 159
치료의 우선순위 163
성미 고약한 노인 167
출구가 모두 막힌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171
광증의 앞과 뒤 175
60년 세월을 건너뛴 우리의 우정 179
치매의 이쪽과 저쪽 183
“여기 강가에서, 이제 나는 행복해.” 187
생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191
모니카의 용기 195
의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199
웃음 전파자 203
그녀는 진정한 투사
환자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만,
그 의사를 진짜 의사로 키우는 건 환자들이다
2017년 2월의 어느 햇살 좋은 날, 시동생의 장례를 치르던 저널리스트 엘렌 드 비세르Ellen de Visser는 붐비는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던 한 종양학 전문의와 마주쳤다. 생전 시동생의 담당의였던 그 의사는 자신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준 환자이자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 짬을 내 찾아왔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 말이 네덜란드 일간지 〈Volkskrant〉의 과학담당 기자로 일하는 비세르의 호기심을 끌었다. 굳이 가르침을 주고받는다면, 환자가 의사에게 받는 게 일상적이지 않을까? 한데 그 반대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 의사 말고도 어떤 특정 환자와 얽힌 사연을 간직한 또 다른 의사들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거나 귀중한 교훈을 던져준 한 명의 환자에 관한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마음먹었다. 별다른 기삿거리 없는 여름 시즌을 메워줄 ‘충전용 시리즈’로, 처음에는 단 6개의 칼럼을 받을 예정이었다. 더구나 기꺼이 글을 기고할 여섯 명의 의사를 찾는 작업도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막상 몇몇 의사와 접촉해보니 상황은 전혀 딴판으로 흘러갔다. 그녀와 만난 의사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놀랄 만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단기 시리즈로 기획한 코너는 매주 실리는 고정 칼럼으로 발전했다. 칼럼의 회차가 쌓여가면서 필진의 범위도 확대돼 간호사와 심리학자, 법의학자와 긴급구조사 등 전방위 의료진으로 넓혀졌다.
독자들의 반응도 폭발했다. 실수와 회한, 보람과 두려움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의료진의 이야기에 감동했다는 편지와 전화, 이메일이 쌓였다. 한 시인은 어느 정신과 의사에게 시 한 편을 헌사했다. 한 노부인은 판단 실수를 고백한 전공의를 직접 찾아 격려했다. 어느 종양 전문의의 사연을 읽던 중년 남성은 아침 식탁에서 그만 펑펑 울고 말았다고 털어놓았다. 임상윤리학자인 에르빈 콤파니에가 20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