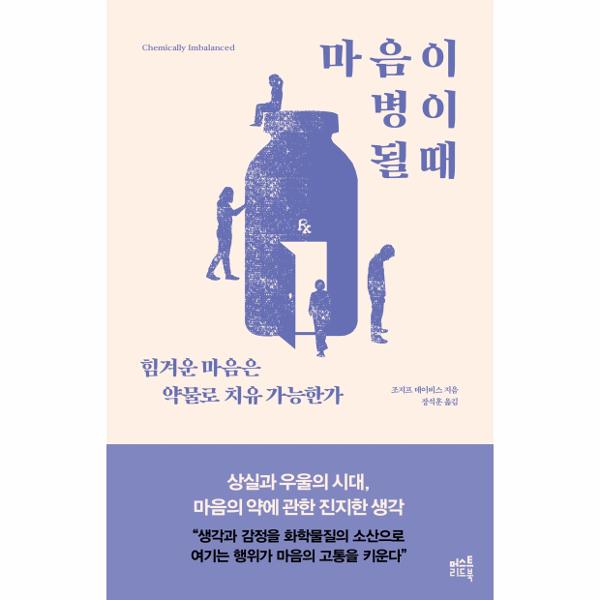“도덕적 결함이나, 생물학적 결함이냐?”
일상의 아픔, 약물치료 그리고 힘겨운 추스름의 역사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약물복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현상의 기원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후 미국 사회에선 정신 건강 문제의 기원을 심리적이며 사회적인 요인에서 찾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득세했다. 이와 함께 신경안정제, 각성제, 항우울제 같은 새로운 종류의 정신질환 약물이 출시되어 의료계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 영향으로 정신요법의 시술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신경증 증상과 정서적 고통을 비롯해 일상의 매우 사사로운 문제까지 의사의 진료 대상에 포함되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정신요법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건수는 급증했고, 1960년대 말 미국 성인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비율은 오늘날의 그것에 육박했다.
정신 건강 문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의 치료법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과 동시에 정신약리학이 활기를 되찾았다. 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약리작용을 주제로 한 대규모 학제 간 연구가 시작되었다. 생물학적 관점을 지지하는 정신과 의사들은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모노아민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매우 파격적인 가설을 제창했다. 뇌의 신경화학적 불균형이 우울증을 초래한다는 이 가설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정신의학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세로토닌만을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항우울제인 플루옥세틴(프로작이 탄생하면서 정신 건강 문제는 신경생물학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다.
이런 변화는 의사를 비롯해 의료계 종사자들이 환자의 정서적, 행위적, 인지적 문제를 치료하고 상담할 때 사용하는 용어도 크게 바꿔놓았다. 자아와 정체성에 관한 내적이고 질적인 1인칭 일상어 기반의 상담은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정신질환에 관한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3인칭 과학어가 대체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