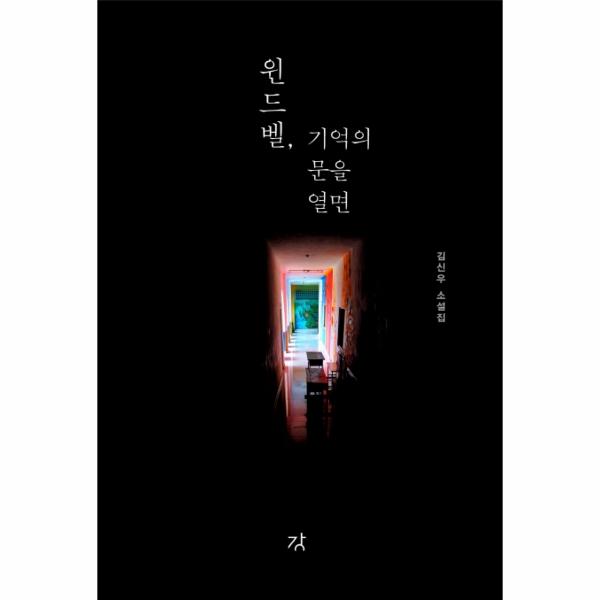수록작 중 「이사」는 한 사람의 삶이 그의 일상을 장악한 미시적 권력에 의해 어떻게 변해가는지 드러내주는 작품이다. 국회의원 비서관인 남편 영호의 곁에서 미진은 ‘비서관의 아내다움’을 매 순간 강요당한다. ‘―다워야 한다’는 말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특히 타인으로부터 흘러드는 명령어가 될 때 그것은 미시 권력의 스위치가 된다. ‘―답다’는 것의 기준은 다분히 그 말을 꺼낸 사람의 상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영호 무리의 기준에 의하면 미진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성의 측면에서도 ‘비서관 아내’의 잣대에 미달된 존재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친절과 배려를 가장하여 타인의 일상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지적하고 나서”고, 미진은 가없는 피로감을 느낀다. 그들 사이에 수직 관계, 즉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굳어져가는 ‘사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무례한 공동체 안에서 환멸을 느끼는 인물의 모습은 김신우 소설의 한 시그니처라 할 만하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장만한 후에도 편향적이고 억압적인 관계의 공포는 계속되고, 마음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으며(「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남편으로 인해 오래된 꿈들을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여도 항변하지 못한다(「이사」.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거나, 대항할 수 없다. 강력하되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를 내면화한 채 살아가거나, 그에 관해 알아차려도 저항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주 보통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물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겹쳐놓고 오래, 들여다보게 된다.
한편 「소녀의 기도」에는 상실의 자국과 징후가 더 진하게 드러난다.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오래전 스스로 목숨을 거둔 소녀, 직접 가해자를 찾아내겠다는 ”집요한 소망”(114쪽으로 전도사가 된 소녀의 언니, 그리고 남편에게 학대당하는 아내인 여민이 있다. 이들의 상처는 공적으로 잘 발화되지 않는 현실의 균열들이다. 가난이나 배제, 소외에서 파생된 문제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더러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심상한 것으로 변질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