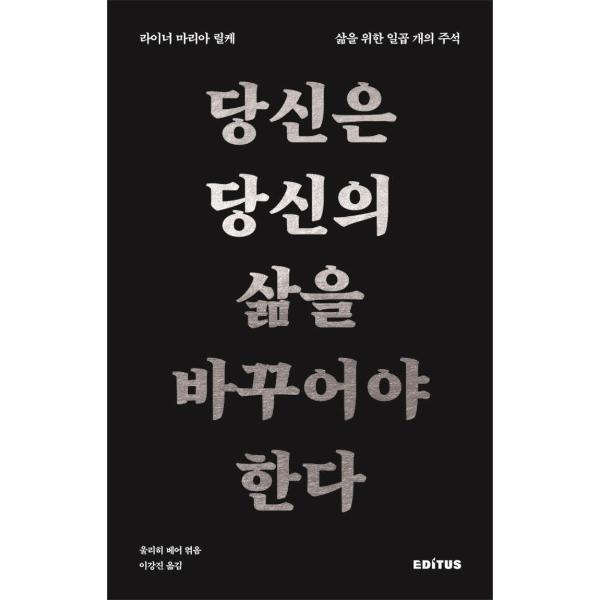이토록 아름다운, 그럼에도 깊고 단호한
“독일에서 시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릴케를 떠올린다”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말이 아니더라도, 릴케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인이 또 있을까? 이것은 비단 그가 세계문학사에 커다란 한 획을 그은 시인이었기 때문에, 혹은 그의 작품들이 우리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결혼식 축사로, 졸업 축하 연설로, 각종 현판의 문구들로, 편지 말미의 장식이나 덕담으로, 도처에서 그의 언어를 셀 수 없이 마주치고 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시인의 언어가 훼손된 것이라 개탄해 마지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릴케의 경우에 한해서라면, 그와 같은 우려와 탄식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 다름 아닌 릴케 자신이, 이미 그의 글이 삶 속에서, 삶을 위하여 읽히기를 바랐던 까닭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그의 언어들이 전모를 이루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19세기 말 유럽의 한구석 프라하에 태어나 20세기 초를 누구보다 뜨겁게 살고 시와 산문을 써내려 갔던 그의 언어가 21세기 우리의 삶에 와닿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삶의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면 그 무언가란 무엇일까? 단지 짧은 만남만으로도 젊은 카프카를 들뜨게 했던 시인 릴케를 우리는 같은 설렘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수많은 쉼표로 이어진 숨 가쁜 그의 산문은 무엇보다 아름답다. 그럼에도 이 아름다움은 쉼표 하나를 두고 곳곳에서 가파르게 단호해지고 깊어진다. 그래서 우선 미려한 문장을 기대하고 이 시인의 산문을 손에 든 독자는 이내 난감해지기도 한다. 시간, 혹은 시대의 간극일까?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이 땅의 독문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옮긴이의 말에서 술회되고 있듯이, 두 해 전 먼 이국 독일에서 작고한 허수경 시인도 그러했을 것이다. 감히 여기서 밝혀 두자면, 처음 이 책의 초벌 번역을 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