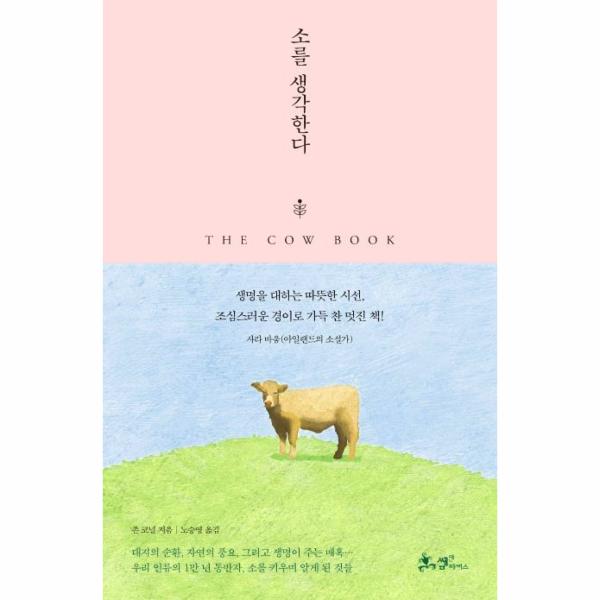대지의 순환, 자연의 풍요, 그리고 생명이 주는 매혹
우리 인류의 1만 년 동반자, 소를 키우며 알게 된 것들
“나는 이 농장에서 나의 월든을, 나의 생업을 찾았다.
나는 농장의 초지를 걸으며 내가 살아 있음을 안다.”
소 키우는 소설가가 들려주는 생명과 자연의 목가
우리가 자연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누추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새롭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모두가 알다시피 그 말은 여전히 진실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물질적 편익을 누리는 대신 자연이 주는 감동과 생명의 경이를 잊어간다. 자연을 복제한 공원의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의 생명들은 정교하게 관리되고 통제된 것일 뿐이다.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연과의 관계를 상실한 대가로 고독을 얻었다.
1853년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매 계절을 지나가는 대로 살라. 공기를 들이마시고 물을 마시고 열매를 맛보고 이 모든 것에 자신을 내맡기라.”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일까. 스물아홉의 아일랜드 청년 존 코널은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고독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소설을 쓰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이 오래전에 떠났던 고향 땅 롱퍼드주의 가족 농장으로, 소와 양을 치는 버치뷰 농장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도우며 ‘자신을 내맡겼다.’
《소를 생각한다》는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고향 아일랜드의 가족 농장으로 귀농하여 아버지를 도와 소 치는 일을 했던 1월부터 6월까지의 경험, 그로부터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사유와 성찰을 담아낸 책이다. 소의 분만을 돕고, 갓 태어난 송아지를 돌보고, 소 젖을 짜고, 병든 새끼 양을 돌보고, 더러워진 우사를 청소하는 등 엄청난 육체노동의 나날들을 보내면서 저자는 지난 1만 년 동안 우리 인간과 함께해온 소의 운명과 역사를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연결, 마침내 살아간다는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아름